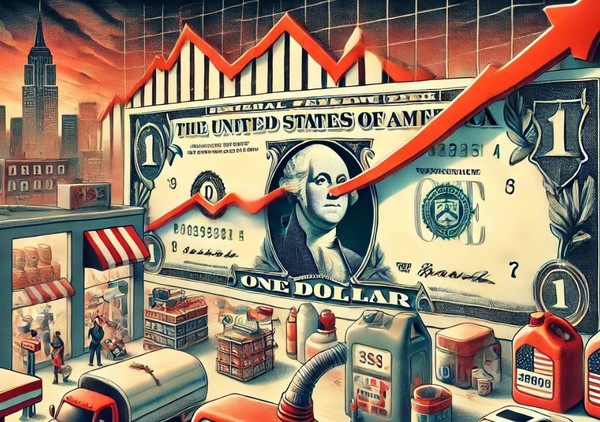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천문학적 부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실질금리가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6조 달러를 상회하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24.35%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비율이 최소한 2030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세 가지 요인에도 여러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는 단기 성장을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한다. 또한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민자 유입은 노동력 공급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국채 시장의 동향이다. 20년기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5%를 상회하는 등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달러 가치는 극단적인 고평가 수준에 도달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통화가치가 실질적인 경제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하락이 동반했다. 이는 미국 자산의 가치 하락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1985년과 2002년에만 관찰된 수준으로 매우 높다”며 “두 경우 모두 이후 상당한 하락이 있었고, 앞으로 2년간 달러 가치는 10~15% 하락할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대응 능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다한 부채, 포퓰리즘적 정책 기조, 방위비 증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내세운 세금 감면 정책은 재정수지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운영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부채 수준과 금리 상승은 서로 상충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책 결정의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미국 경제의 단기적 호황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경제 전반이 미국 경제가 지닌 심각한 리스크를 나뉘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